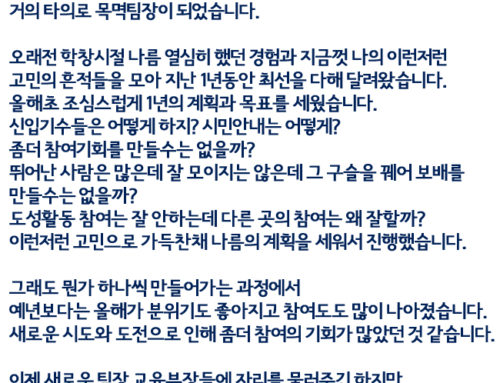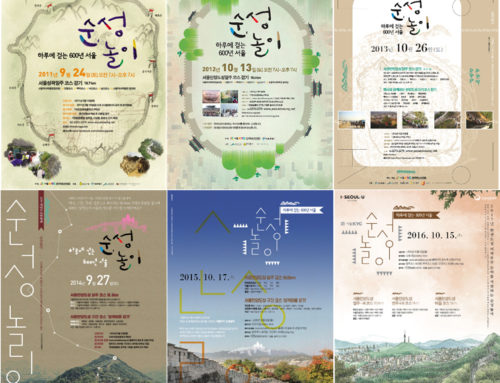휴가를 내서 오랜만에 고향집에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내서 오랜만에 고향집에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주 시내를 거쳐 변두리로 나오면 논밭과 산에 둘러싸인 우리 동네가 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사무실과 공장이 조금쯤은 들어섰지만,
아직도 마을에 구멍가게만 하나 있는, 소비생활과 문화생활과는 동떨어진 동네입니다.
삼십 년 전까지도 마을 냇가와 공동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멱도 감던,
혹여 집에서 큰 소리내며 모녀간 싸움이라도 하고 난 다음날이면
동네 아줌마가 놀러오는(염탐이 틀림없는)
일을 서로 돕거나, 먹을걸 나눠주거나, 십원내기 민화투를 치러 마실다니던 동네입니다.
저희 집은 남촌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명칭이지만 모산 쪽에서 흘러나와 마을을 가로지르던 냇물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이 나뉘고 산골 쪽은 서당골로 불렸습니다.
북촌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마을회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서자
비닐멍석 위로 햇볕에 말리고 있는 옥수수 알들이 보였습니다.
옥수수가 끝물이어서 센(먹기엔 지나치게 익은) 녀석들을 따다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씨로 쓸만한 좋은 옥수수를 골라 통째로 말려 벽에 걸어놓았는데
요즘은 외국계 종묘회사에서 만든 비싼 씨를 쓸 뿐만 아니라 번식이 어렵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말려봤자 뻥튀기에나 쓸 뿐입니다.)
부모님이 십오년 넘게 농사일을 하셨어도 도와드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부모님보다 제가 더 힘이 센 나이가 되니, 그냥 있기가 미안해집니다.
센 옥수수를 따러 간다기에 옷을 갈아입고 신을 바꿔신고 밀집모자와 목장갑을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둘이 하면 시간 더 걸렸을텐데 너랑 셋이 해서, 어이구~ 일찍 끝났다.”
는 어머니의 칭찬을 듣자, 함께 살지 못하는 것도, 내 일을 하느라 부모님 일을 돕지 못하는 것도
부모님이 나이들어 가는 현실도 모두 안타까워집니다.
몸이 두 개 였으면 좋겠습니다.